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제는 화장[火葬]하는 게 부검실에 보관된 미라들을 위하는 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지난해 12월, 김한겸 교수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며 꺼낸 한마디였다.
현재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병리과에 재직 중인 김 교수는 국내 미라 연구 권위자로 명성이 자자하다. 김 교수가 그동안 누구보다 미라 연구에 힘써왔던 사실은 익히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 만남에 앞서 심심치 않게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미라를 얘기하는 그의 목소리에서는유난히 찼던 이날 바깥공기와 손에 쥔 따뜻한 커피와도 같은 온도차가 느껴졌다.
김 교수는 미라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기자를 병원 내 부검실로 안내했다. 김 교수가 보존 중인 미라는 총 8구다. 4구는 이 병원 장례식장 옆 부검실에, 나머지 4구는 의과대학 실습실에 보관돼 있다.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부검실 문을 열자 층층이 놓인 관 4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김 교수는 경기도 오산에서 발견된 여성 미라 중 1구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미라를 보기에 앞서 혹시 모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책장에서 조심스럽게 내린 관을 침대에 올리고, 김 교수는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생전 처음 맡아본 낯선 냄새와 함께 미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반듯이 누운 채 두 손을 살포시 골반 위에 올려둔 미라는 150cm 정도의 키에 체구는 왜소했다. 까맣고 구불구불한 머리카락과 벌린 입 사이로 드러난 가지런한 치아가 눈에 띄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2010년 경기 오산의 한 공사 예정지에서는 잇따라 조선시대 여성 미라 2구가 발견됐다. 첫 번째 여성 미라 발굴 당시 옆에 무덤이 하나 더 있었고, 남편의 묘일 것으로 추측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두 번째 묘의 뚜껑을 열자 또다시 여성 미라가 나왔다.
두 여인이 각각 잠들어있던 회격묘 안 내관 덮개에 적힌 `儒人駒城李氏之柩(유인구성이씨지구)`와 , `宜人驪興李氏之柩(의인여흥이씨지구)`라는 명정을 통해 남편의 관직 품계에 따라 정9품 또는 종9품 작위, 정6품 또는 종6품 작위를 받은 사대부집 가문의 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남편이 갓 관직에 오르자마자 첫째 부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새 부인을 맞은 것으로 추측됐는데, 김 교수가 기자에게 보여준 미라가 바로 첫째 부인인 구성이씨다.

김 교수는 두 여인과의 만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어버이날이었던 거 같아요. 오산에서 미라가 발굴됐다고 해서 부모님한테도 가지 못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진짜 있더라고요. 날이 더워서 혹시나 상할까 싶어 일단 확인만 하고 병원으로 가져왔어요. 관이 엄청 크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아주 어린 여성 미라더라고요. 주변에 남자 미라가 있을 것 같아 땅을 더 파보자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관이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먼저 발견된 미라의 남편이지 않을까 했는데 관을 열어보니까 또 여자더라고요. 첫 번째 미라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이후에 주변을 파서 발견된 관에서 남편이 나오긴 했는데 썩어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명정을 보니까 첫 미라는 남편의 관직이 좀 낮고, 두 번째는 그보다 3품 정도 높더라고요. 첫째 부인이랑 둘째 부인이었던 거죠. 살아서는 만나지 못했을 두 사람이 죽은 후에야 만나게 된 거죠. 두 분이 지금 나란히 부검실에 계세요. 서글프죠.”
연이어 발견된 데다가 전처와 후처라는 특별한 관계 탓에 두 미라는 세간의 이목을 톡톡히 끌었다. 또 복식과 현훈, 운아삽, 뒤꽂이, 목제빗 등 다수의 유물들이 잘 보존된 형태로 출토돼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 거란 기대도 안겼다.
그러나 두 여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너무나 빠르게 잊혀졌다. 2019년 현재, 잠들어 있던 관과 입고 있던 옷가지, 부장품을 모두 잃고 몸만 남은 두 여인은 김 교수가 마련해준 관에 누워있다.
파평윤씨 모자(母子) 미라도 그중 하나다. 2002년 발굴된 윤씨 모자 미라는 20대 중반의 여인이 출산 중 숨진 미라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사망 후에도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발견돼 화제를 모았고 미라 박물관을 만들어 보전·전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역시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의 불청객 신세가 됐다.
이 모든 비극은 국내에 발굴된 미라의 관리나 보존과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데서 시작된다.
미라를 문화재보호법이나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유교 사상이 짙어 조상의 시신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사회에서 미라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연구를 했을 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 교수를 비롯한 미라 전문가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미라를 발굴 및 보존·관리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해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때문에 발굴된 미라들은 김 교수같이 연구자들에 의해 관리되거나 가문의 자손이 찾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근거해 대부분 화장 처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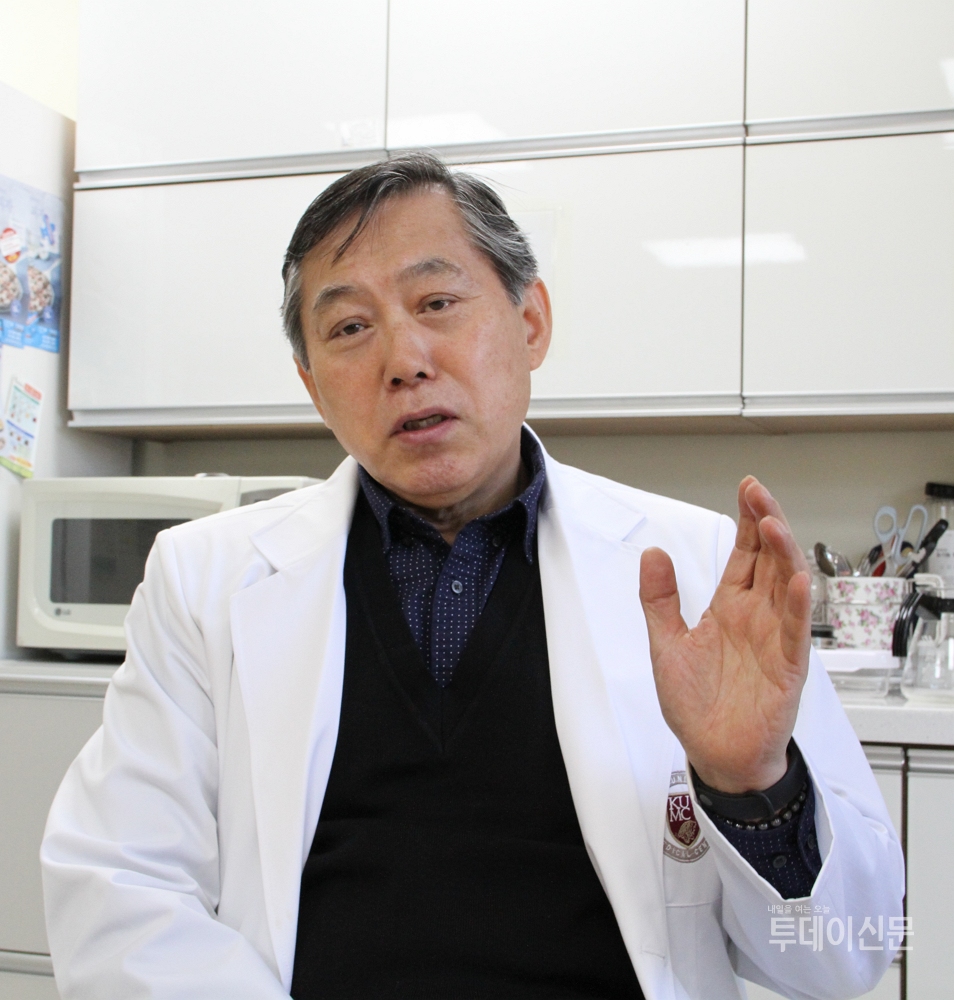
“2018년에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제까지 발견된 미라가 59구 정도일 거예요. 언론에 등장해서 그렇지 한국에는 실제로 미라가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에 들어있으니 문제죠. 이집트 미라는 가져다가 전시도 하는데 정작 자국의 미라는 박해하는 것 같아 안타깝죠.”
김 교수는 값비싼 부장품에만 관심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었다.
“미라는 죽기 전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먼 과거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등을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미라가 입고 있던 옷이나 부장품뿐이에요.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주인공은 미라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 같아요. 가장 괴로운 건 ‘미라가 왜 중요하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부장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누구보다 미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김 교수이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미라 연구를 통해 많은 걸 밝혀냈지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제 역할은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 아니라 박물관이나 국가가 나서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화도 많이 났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걸요.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부검실이랑 실습실에 있지만 2년 후면 저도 정년퇴임이에요.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 화장 처리가 되겠죠.”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7년까지 파악된 미라 출토 현황은 59구(백골화·반미라 포함). 이 중 35구 만이 보관 중이며, 단 3구만이 박물관에서 전시 및 관리 중이다. 연구 중인 나머지 미라들은 언제 한줌의 재로 변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서도 자신이 병원을 떠난 후 남겨질 미라들의 앞날 걱정에 김 교수의 한숨은 날로 깊어져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