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영 지음/256쪽/ 148*210mm/1만6000원/동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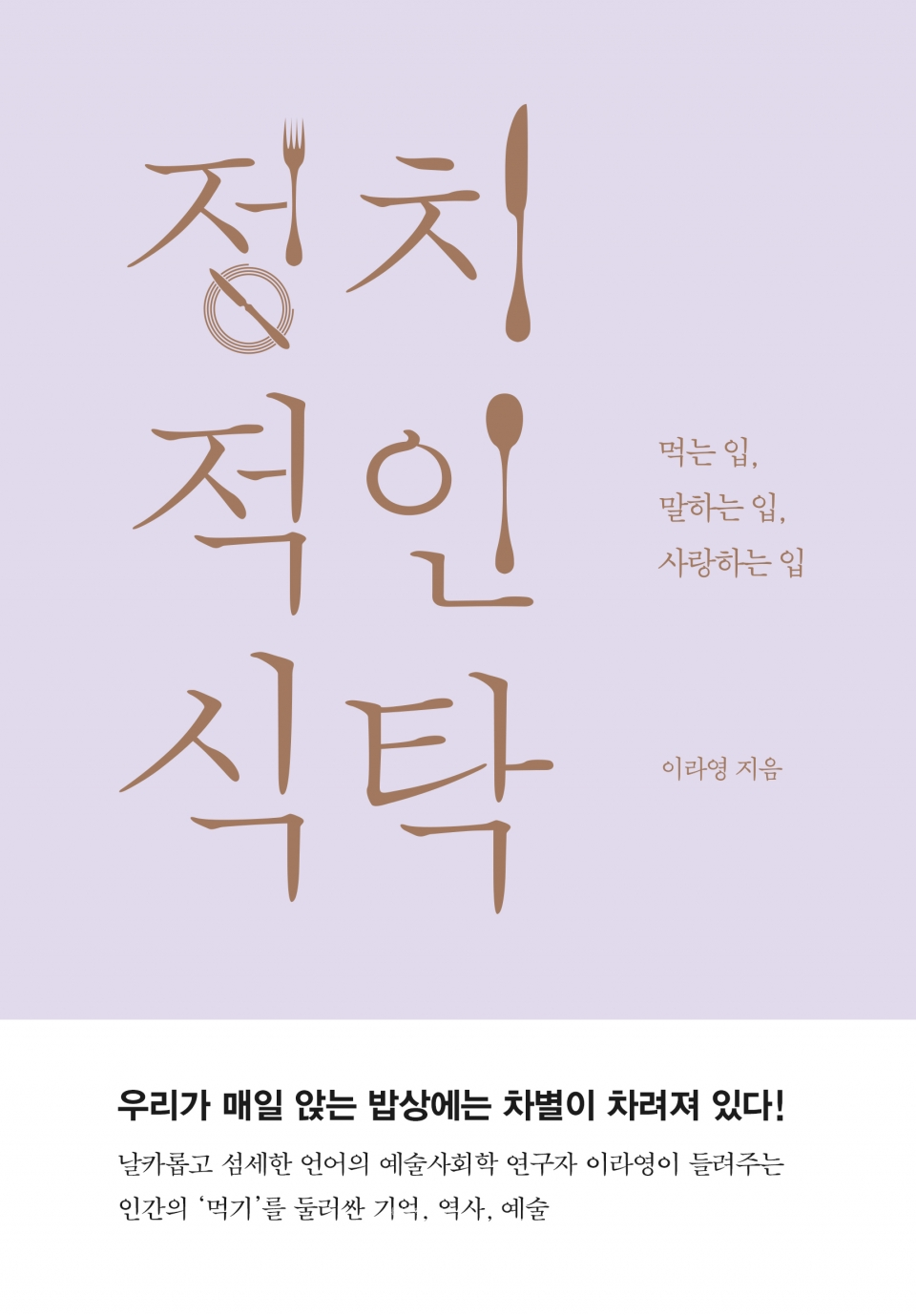
나는 내가 남긴 밥을 엄마가 먹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좋았다. 엄마한테 덜 빚진 기분이다. 날마다 내가 쏟아내는 오물을 처리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마저 내가 뒤섞어놓은 잡탕일 필요는 없고, 내가 남긴 밥을 엄마가 꼭 먹어야 모성을 인증하는 것은 아니니까. 엄마 밥상의 존엄을 빼앗으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엄마가 무슨 잔반 처리기인가. _48쪽
이른바 ‘결혼적령기’였던 나와 50대 여성 청소노동자, 우리는 바로 ‘번식녀 계급과 청소부 계급’이었다. 청소부보다 사정이 나은 ‘번식녀’는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커피 마실 돈이 있는데도 ‘된장녀’가 되는 것이라면, 번식의 세계에서 멀어진 청소부는 아예 투명인간이 되어 커피 마실 자리조차 없다. 번식녀인 나는 벌어서 ‘스펙’ 쌓기를 반복하며 젊은 날이 지나갔고 밥값을 절약하기 위해 도시락을 두 개씩 싸왔지만, 사무실에서 먹을 수는 있었다. 청소부는 그 자리조차 없다. _127쪽
【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 우리가 매일 앉는 밥상에는 차별이 둘러져 있다? ‘먹기’에 얽힌 기억, 역사, 예술, 그리고 차별 이야기를 담은 책 《정치적인 식탁》이 출간됐다.
예술사회학 연구자로 《여자 사람, 사람》(전자책),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타락한 저항》 등을 펴낸 저자 이라영은 왜 누구는 먹기만 하고, 누구는 만들고 치우기만 하는지, 식탁 위에 놓는 음식들과 먹는 취향이나 방식은 언제 정해졌는지 등 밥상에 숨어있는 고도의 정치를 찾아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식탁 위 음식이 아닌 식탁을 둘러싼 사람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탁의 풍경을 낯설게 그리고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식탁을 바라보면 ‘먹기’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나 즐거운 휴식만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맛있는 밥상과 따뜻한 부엌은, 다른 누군가에게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자 오랜 외로움의 장소다. 이 책은 공기처럼 편안한 관계에 스며든 은밀하고 집요한 권력이 식탁의 약자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일상 곳곳을 향한 저자의 예리한 시선은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된장녀’와 ‘김치녀’에는 여성의 취향을 마음대로 규정하고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 ‘바나나’나 ‘소시지’는 남성에 대한 대상화가 아닌 이를 먹는 여성에 대한 대상화라는 사실을 꼬집는다. 중요한 역사적 현장으로 여겨져온 루터의 탁상담화 식탁,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나왔던 필라델피아의 선술집 식탁, 대공황 당시 이민자의 식탁, 탈북민의 식탁, 인디언의 식탁까지 ‘먹기’를 둘러싼 이야기는 시공간을 넘나들고 있다. 또한 매 꼭지마다 어우러져 있는 미술 작품들은 다른 각도에서 통찰을 제공, 글에 다채로움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식탁을 차릴 수 있을까. 식탁의 약자는 사회의 약자와 겹치므로 식탁이 변하려면 사회도 변해야 하고, 사회가 변하려면 식탁부터 변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이처럼 ‘입의 해방’이 모든 변화와 이어지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