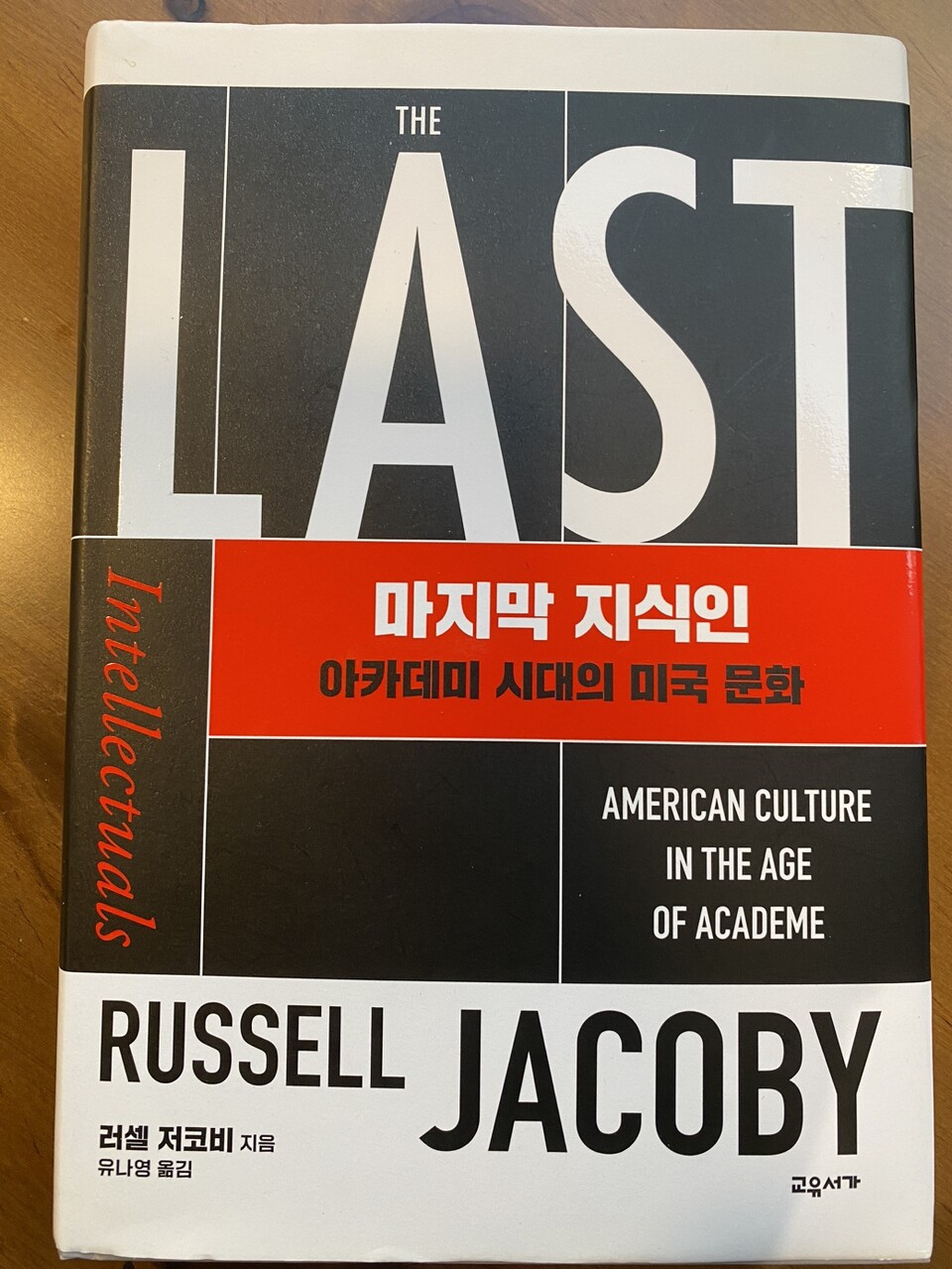
▪ 11월 21일 월요일
러셀 저코비의 문제작 <마지막 지식인>이 마침내 번역되었다.(실은 올 상반기에 출간된 책이라 이런 호들갑은 다소 뒤늦은 것이다) 교양 독자층에서는 그의 책과 그 논지에 대해 비교적 잘 알려진 편이다. 번역이 되기 전에도 여러 경로로 그 논지가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지식인>의 머리말은 해럴드 스턴스가 101년 전(1921년)에 던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우리의 지식인들은 어디 있는가?” 도발적인 질문이다. 스턴스의 답변은 당대 지식인들이 유럽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그 자신 또한 그 행렬에 뒤이었다.(적대적인 상업 문명에 대한 저항으로 그는 보았다)
대중과 소통하는 지식인이 사라진 시대
러셀 저코비가 1987년에 이 질문을 반복할 때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답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의 답변인즉슨 지식인들이 대학 안에서 안온(安穩)하게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 답변이 아니라 비판적 평가다. 달리 말해서 러설 저코비의 질문은 지식인이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는 일갈을 담고 있는 수사적인 물음이다.
상아탑 안에서 논문 편수를 채우는 데 몰두하는 연구 노동자는 차고 넘치지만,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공 지식인은 사라지고 있다. 설혹 당대 현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를 학계의 전문적인 언어가 아니라 대중의 일상적인 언어로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이(“명쾌하게 글을 쓰는 지식인”, 8쪽)가 거의 소멸했다는 것이 저자의 관찰이다.
“나는 금세기 전반의 공공 지식인이 세기 후반의 대학 학자로 세대 변동이 일어났음을 감지했다. 그들은 더 전문적이고 배타적이 되었다. 동시에, 갈릴레오로부터 프로이트에 이르는 사상가들이 갖추었던 대중어 구사 능력을 상실했다.”(16쪽)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현실
그런데 저코비는 UCLA(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이며, <마지막 지식인>도 20세기 미국의 지식인들의 역사에 대해 다룬 지성사 책이다(그리고 학술 독자 이전에 교양 대중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교양 서적이다). 그러나 저코비의 논지는 21세기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우리 곁에 대중의 언어로 대중과 소통하는 지식인은 어디 있는가?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에는 사회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큰 어른들이 있었다. 함석헌 선생의 칼럼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나 김지하 시인의 담시 <오적>과 같은 공공 지식인의 글이 대중에게 영향을 주던 시대였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큰 스승의 가르침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 지식인이 더 이상 대중에게 당대의 현안을 가지고 말을 건네지 않는다. 애초에 대중도 더 이상 지식인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물론 그 분기점은 기본적으로 학술 논문을 대량 생산을 촉구하는 정부와 대학의 공조일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연구자들이 논문 편수를 채우는 데 몰두한 상황이다. 하지만 동시에 SNS의 일상화에 따라 진행된 부족주의 확산에도 기인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논문만 쓰고 있지는 않다. 페이스북 등 여러 공론장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니, 실은 예전보다 더욱 많이 외치고 있다. 문제는 이른바 우리 편을 상대로만 말을 건네고 있다는 점에 있다.
공공 지식인은 보편성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다.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이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는 반대 진영에서조차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올바른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 공론장에서 발언하는 지식인들을 보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거의 예외 없이 당파성에 치우쳐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인들에게조차 주장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이 내 편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대중을 위해 절실한 것은 정직한 제너럴리스트다
이게 바로 역자가 “이제는 무책임한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스페셜리스트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365쪽)라고 지적하는 이유일 것이다(역자는 공공 지식인과 학술 연구자를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에 대응시킨다).
하지만 무책임한 제너럴리스트(공공 지식인) 대신에 필요한 것은 정직한 제너럴리스트이다. 스페셜리스트는 어디까지나 학계에서 말하는 존재고, 대중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직한 스페셜리스트는 학계에 필요하고, 정직한 제너럴리스트는 대중에게 절실하다(무책임한 지식인은 어디서든 불필요하고 해로운 존재다).

인간은 세우고 신은 허문다.
인간의 지식 탐구는 끝이 없는 수고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앎에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의 소박한 지적 탐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평자가 <마지막 지식인>을 읽으며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양 독자의 중요성이다. 대중 지식인은 교양 대중과 함께 간다. 결국 공공 지식인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교양 독자들이 그들의 글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 또한 독서 모임을 만들어 함께 읽어야 한다. 공공 지식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독서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서를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 미리 안내 혹은 경고하고 싶다. <마지막 지식인>은 두툼할뿐더러 전세기(前世紀)를 살다 간 서구의 사상가들이 숱하게 등장한다. 분명 21세기 한국에 발을 딛고 서 있는 평범한 독자들이 읽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 하지만 글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심지어 읽는 재미가 있다. 낯선 이름들을 조금만 참고 읽어가노라면 한 시대의 지적 풍경이 한눈에 다가오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동시에 우리 시대의 지적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