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음 | 266쪽│140×200│1만8000원│시크릿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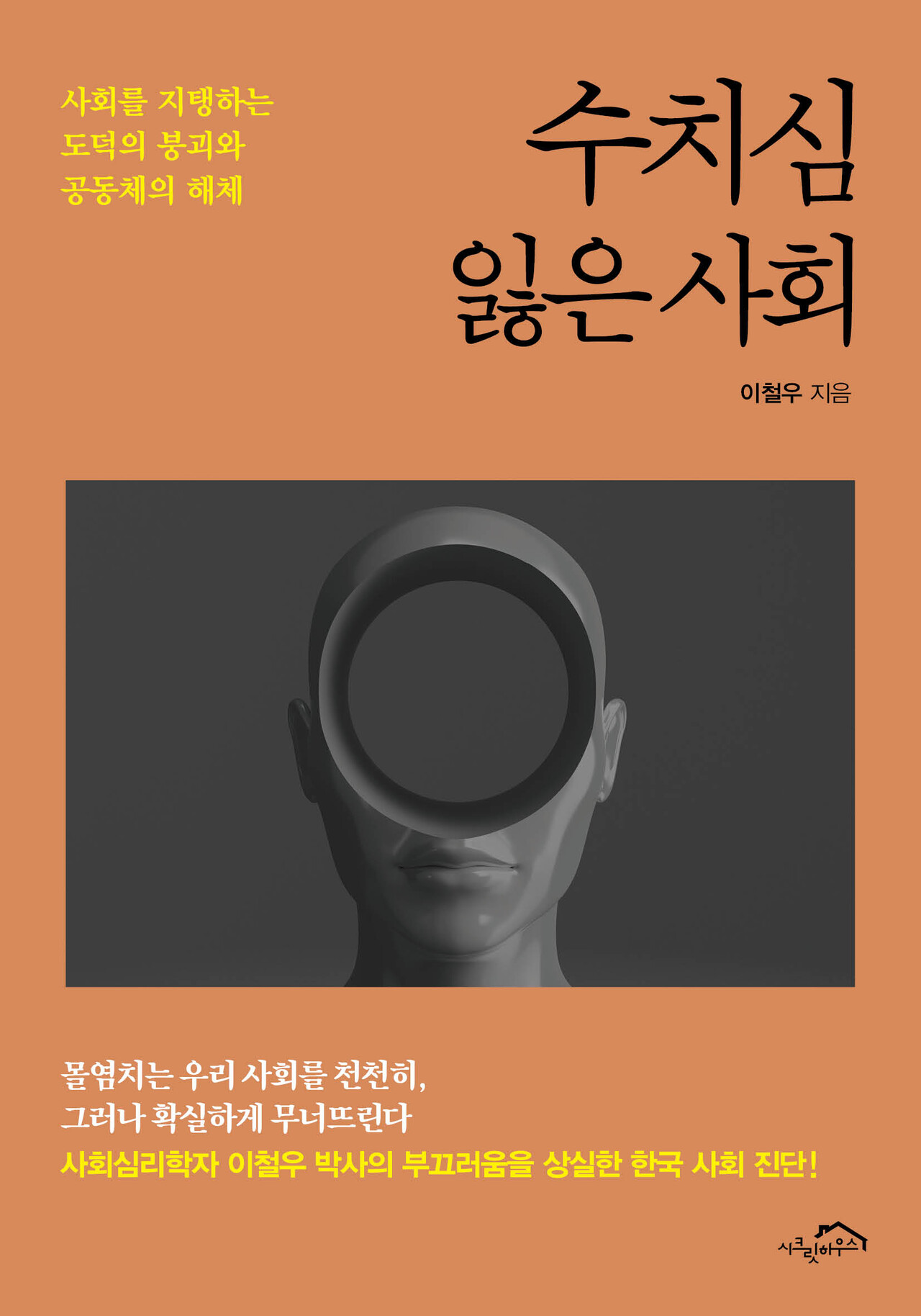
수치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건강한 눈, 타인의 정직한 시선, 그리고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진 도덕적 기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치심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하나의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준의 붕괴이며, 건강한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_본문 중에서
【투데이신문 박노아 기자】“부끄러움을 잃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회심리학자 이철우 박사가 신간 <수치심 잃은 사회>를 통해 던지는 물음이다. 그는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 법조인의 거짓 해명, 일상의 소소한 몰염치까지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한 ‘수치심의 상실’을 진단하며,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붕괴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 박사는 책을 통해 수치심을 단지 개인의 열등감이나 실패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관계적 감정’이자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하는 핵심 정서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감정의 뿌리를 추적하고, 왜 다시 수치심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또한 그는 수치심이 사라질 때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파괴되는지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감정이 바로 이 ‘수치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놓지 않는다. 이 박사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며 이를 살려내기 위한 실천과 교육,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수치심에 대한 교육’이야말로 앞으로의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 교육이며, 민주주의 감수성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고 역설한다.
<수치심 잃은 사회>는 무례함이 솔직함으로 둔갑하고 책임 회피가 전략이 된 시대에 우리가 잊고 있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의미를 다시 일깨운다.


